산골에서 가장 먼저 겨울을 떨치고 일어서는 것이 생강나무꽃이다. 진달래보다도 부지런하다.
촌스러운 티를 내자면, 난 산골로 둥지를 틀고나서야 생강나무꽃을 처음 보았다.
도시에서야 어디 그런 것을 볼 기회가 있는지.
산이야 많이 갔지만 등산로가에는 어떤 꽃이든 살아남을 수가 없다. 혼자만 가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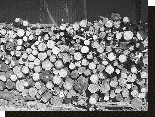 | ||
잎과 줄기에 생강냄새가 난다 하여 붙여진 이름인가 보다.
생강나무는 아기나무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병아리처럼 해맑은 노란색에, 꽃송이가 눈송이만해서 붙여진 이름이지 싶다.
산골에 앉아있으니 `해몽'도 잘한다.
한 달 전에 친정집이 쑥대밭되는 소리를 들었다. 셋째 형부가 위암이란다. 안그래도 `병원알러지'가 있는 친정 식구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쑥대밭을 수습해야 했다.
난 형제가 많다. 그 많은 형제들이 한 핏줄임을 자랑이라도 하듯 우애가 좋다.
그러니 배씨 일가가 모두 침묵과 슬픔으로 빠져드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다.
산골에 앉아있는 나 또한 그 수순에서 비켜갈 수는 없었다.
그런중에 셋째 형부가 산골을 다녀가시겠다는 연락이 왔다. 항암치료를 시작하기 며칠 전이라 의외였다.
항암치료라는 것이 제 아무리 장사라도 종이인형처럼 되는 버거운 작업아닌가.
한밤중에 산골에 도착한 언니와 형부.
항암치료를 받기 시작하면 산골이 멀어 근력이 따라줄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니 눈으로 보고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란다.
아마도 어울리지 않게 산골로 가 농사짓는 막내 처제가 평소에도 눈에 밟혔으리.
그러다 상황이 나빠지니 산골이 더 걱정스러워지셨겠지.
사람이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것이 따뜻한 면도 있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지를 나이들면서 알게 되었다.
형부의 그런 마음을 거울들여다 보듯 꿰게 되니 말이다.
산골에 사흘 머무르시는 동안 눈이 왔다.
그 새벽에 화장실가는 길이며, 나무보일러실가는 길, 아이들 자전거타는 코스, 물길러 가는 길을 실핏줄처럼 치워놓으셨다.
나무를 땔 때마다 나무해 주고 가야하는데를 시조읊듯하시더니 그 먼 호수밭가에 쓰러진 나무를 죄다 매고와 잘라서는 차곡 차곡 쌓아놓으셨다.
그 밭은 맨 손으로 올라가도 입에서 화약냄새가 나는 코스.
산골의 물이 얼어 안나오니 물통마다 그릇마다 개울가에서 물을 길어다 내가 쓰기 편한 자리에 악세사리 진열하듯 줄지어 놓으셨다.
바람도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마력이 있는지 그 날은 그리도 산골을 뒤흔들었다.
아니나 다를까.
눈만 흘겨도 나동그라질 것같던 보일러실 문이 드디어 자리에서 박차고 나와 나뒹군다.
형부는 그 오래된 문을 퀼트하듯 짜집기해 거뜬히 달아 놓으셨다. 손재주없는 초보농사꾼, 속으로 감사의 박수를 쳤으리.
사람이 돌아가고 나면 흔적만이 찐하게 얼룩져 남아있는 사람의 눈을 오랫 동안 간지럽힌다. 화장실가는 길에도, 장작더미에도 커피자국처럼 흔적이 남아 가슴을 저리게 했다.
그러나 언제나 산골은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다. 도시에서는 흔적수습하는데까지밖에 할줄 몰랐었는데, 산골로 와서는 그 다음을 준비하게 된다.
내가 더 열심히 산골답게 살아야 할 이유를 거기에서 찾는다.
산골식구들을 걱정하는 이들에게 생강나무꽃처럼 작지만 영롱한 희망을 심어주어야 할 의무같은 것 말이다.
얼마 전에 읽었던 검은 발 족 인디언 추장의 글이 생각난다.
"삶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밤에 날아다니는 불나방의 번쩍임 같은 것. 한겨울에 들소가 내쉬는 숨결같은 것. 풀밭 위를 가로질러 달려가 저녁 노을 속에 사라져 버리는 작은 그림자 같은 것.''
그렇다.
나는 장작더미에서 용감하게 `그' 장작을 가져다, `그' 보일러실 문을 열고 들어가 불을 지펴야 한다.
불길이 활활 타올라 15평 남짓한 오두막을 뎁힐 때 , 잠시 얼어있던 나의 꿈과 희망이 녹아 꿈틀거리리.
그리고 그것들이 생강나무꽃처럼 피어 다른 사람의 가슴에 `씨앗'으로 남으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