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눈이 온다.
비가 왔었는데 어느새 눈으로 바뀌었는지 모른다. 그는 소리없이 오니까.
어느 시인은 눈오는 소리를 여인의 옷벗는 소리라고 표현했던데 난 아직 옷벗는 소리를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귀고래를 소제하고 마음을 청정하게 먹고는 얼굴 양쪽에 붙어 있는 구멍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그러는 사이 눈을 쌓이고 쌓여 고립이 되었고, 내가 원하는 소리는 걸려들지 않았다.
거기까지도 좋았는데 정전이다.
고립은 단절이 아니고 내 내면과의 소통시간이다.
산골은 정전되면 내 눈만 어둑해지는 게 아니다.
물이 안나오고, 보일러도 안돌아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어떤 상황에서도 즐겨야 한다.
고립되지 않고, 정전되지 않았으면 잡사에 시달리느라 못보았을 책을 촛불켜고 본다.
벽난로의 밝음과 촛불의 밝음보다 책이 마음을 밝히는 촉수가 더 대단하다.
다음 날에도 눈은 하루가 지난줄도 모르고 계속 내리고 있다.
눈은 그리움이라 그리움이 눈보다 더 높이 쌓인다.
기숙사에 있는 아이들이 그리워 그 모습 그대로 눈사람을 만든다.
목도리도 감아준다.
눈으로 고립된 산중이지만 하루는 이렇듯 내면의 강이 따사롭게 흐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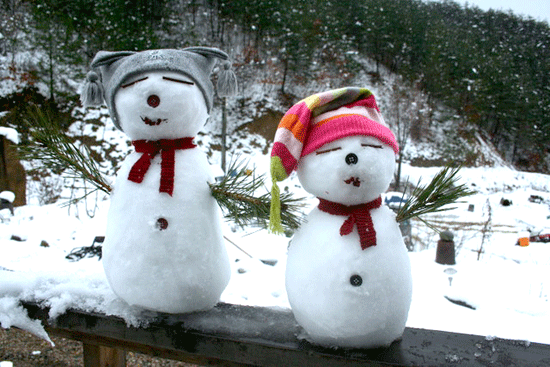




배동분 집필위원
sopiabae@yaho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