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하고 더욱 놀라운 사실 중 하나는 초보농사꾼의 손재주다. 손재주 없는 거야 팔자려니 한다지만 엎친데 덥친격으로 “기계캇다.
도시에서 살면 아무 문제가 없는 단점이다. 아파트에 살았으니 모든 것은 관리실에서 해결해 주고, 그것이 어려운 일은 그 분야의 기사를 부르면 되는 일이었다.
그러나 시골살이는 그게 그게 아니다.
직접 나무와 못으로 뚝딱뚝딱 만들어야 할 일도 많고,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을 스스로 고쳐야 한다. 그러니 난 기회 있을 때 마다 귀농의 기본은 “손재주와 기계다루는 솜씨”라고 노래를 부를 수밖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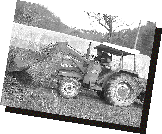 | ||
처음에 트렉터를 운운하기에 절대로 안산다고 못을 박았다. 왜냐하면 그 비싼 기계를 사서 막 다루면 매일 고장일 텐데 고치지도 못하고 그 먼 곳까지 실어다 고쳐야 하는데... 그것은 덩치가 커서 우리 차로 싣지도 못해 기사와 차가 세트로 와서 모셔가야 한다.
사람이 손재주가 없으면 좀 조심성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성격이 급하니 기술보다 기운이 앞서니 빠그러뜨리기 일쑤... 그러니 말릴 수밖에. 돈이 들어도 트렉터 가진 사람을 사서 밭을 갈자고 했다.
그러나 그게 해보니 돈이 아까워서 기계를 사는 것이 아니라 나 필요한 시기에 밭을 갈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다.
너도 나도 밭을 갈아야 하는 시기라 때를 놓치기 일쑤이고, 큰 돈 들여 갈아놓고 비가 오면 말짱 꽝이다. 그 고충을 모르는 내가 아니지만 그래도 그리 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할 때는 어떤 고민이 있는지 아는 사람은 다 알리... 하여간 샀다.
중고... 농기계 수리센타에서 그것을 실어다 주었다. 초보농사꾼은 사람들이 돌아가자 그 놈을 끌고 그답 밭으로 간 것. 그런데 밭에 갔다 왔으면 그 꿈에 그리던 트렉터가 어떻다 저떻다 말을 해야 하는데, 조용하다. 뭐 중고라 신이야 날까마는...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 날 트렉터 날을 그답 하나 부러뜨렸단다.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지 했다.(나도 이쯤 되면 대담해진다. 말이 대담이지 속 터짐이 무뎌진다는...)
그리고 오늘... 우리집에 트렉터가 왔다니 초보농사꾼보다 설치는 사람은 단연 산골소년. 만져라도 보고 온다고 밭으로 가는 아이. 거기까지면 좋겠지만 초보농사꾼이 또 누군가. 선우에게 잔뜩 바람을 넣는다. 그러더니 아니나 다를까.
어디서 엔진소리가 요란하게 나서 보니 벌써 선우에게 트렉터를 가르쳐주고 있다. 호기심 많은 박씨 일가의 당연한 모습이다. 퇴비더미를 들어올렸다 놓았다를 시키더니 이제는 후진까지 시킨다. 초등학교 5학년짜리에게...
그 퇴비더미 자리 밑은 다시 계단식으로 밭을 만든 자리기에 위험하다. 그러나 두 부자는 알바 아니다. 선우도 세레스 운전 연수 경험이 있어 그보다 쉽다며 좋아서 침을 꿀꺽꿀꺽 삼킨다. 이제는 말릴 기운도 없고, 말려서 될 일이 아님을 나 또한 터득한 후라 바라만 보다 들어왔다. 조수가 오두막으로 오고도 모습을 보이지 않는 초보농사꾼.
선우말로는 아빠는 달밭으로 가시면서 밭을 다 갈아놓고 오신다고 했단다. 그러면이야 오죽이나 좋을까... 저녁에 풀이 죽어 어둠을 안고 들어오는 초보농사꾼 얼굴엔 어둠만큼이나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있었다.
답은 하나. 된장인지 똥인지 찍어 먹어보지 않아도 안다 난. 나의 고민은 어떻게 고장이 났을까가 아니라 얼마나 견적이 나올까다.
이쯤되면 영화가 끝나야 뒷맛이 깔끔하다. 그러나 어느 영화를 봐도 영화가 끝나면 중요한 마지막 컷은 오랫동안 고정시켜 두지 않은가. 스탭진들의 이름이 거미가 거미줄을 유연하게 타오르듯 죽 위로 올라가는 동안 말이다.
그럼 난 오늘의 하일라이트 중 어떤 컷을 고정해야 할까. 단연 달밭 중간에 오도가도 못할 지경이 되어 기사와 차가 그 먼 봉화에서까지 와야 모셔갈 수 있게 해놓은 그 트렉터 컷을 올려야 하지 않을까.
차가운 벽에 달랑 걸린 달력이 을씨년스러워 보인다. 밤하늘의 달도 예사롭지 않게 보이고, 걸어온 제 발자욱을 자주 돌아보는 시기... 신이 이런 시기도 만들어주어 내 안의 뜰도 단속할 수있으니 다행이다싶다.
인디언의 격언 중에 이런 구절이 생각난다. “내 뒤에서 걷지 말라. 난 그대를 이끌고 싶지 않다. 또 내 앞에서도 걷지 말라. 난 그대를 따르고 싶지 않다. 다만 내 옆에서 걸으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렇다면 난 지금껏 어떤 사람들과 어떤 위치에서 걸어왔는지 잠시 가던 걸음을 멈추고 길 위에 서서 그 위치를 다독이고 싶다.
배동분 집필위원
sopiabae@yaho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