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방 물에서 헹구어낸 냉이처럼 상큼한 일이라는 것이, 어쩌다 생기는 특이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산골에 와서 터득하게 되었다. 어린 아이가 글자 깨우치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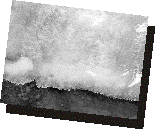 | ||
덤이란 박속처럼 하얀 이를 드러내고 시리도록 웃게 하는 그 무엇...
작년의 일이다. 연말에 알 수 없는 감정이 있었다. 그냥 특별한 일이 없는데도 가슴이 뭉클 뭉클하고, 울먹여지고 그러다 누가 말만 걸어와도 눈물이 쏟아지고...
그 연말을 보냈다. “내 마음 나도 몰라”로 일관하며...
그리 연말을 보내고 새해가 되니 그 희귀병(?)이 씻은 듯이 사라졌다.
왤까?? 그것은 홈페이지라는 것을 처음 열고, 그곳에서 사람냄새와 정을 맡으며 물설고, 낯설고, 땅설은 울진에 정을 붙이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내겐 홈에 오는 분들이 그냥 마실꾼이 아니었다. 그들에게서 힘을 얻었고, 용기를 얻었고, 그들의 향기를 맡음으로써 손에 서툰 농사를 진지하게 해낼 수 있었다.
그런 한 해를 보내려니 가슴벅차옴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오는 병이었다. 선무당이 사람잡는다고 내 정확한 진단결과 그랬다. 그런 진단은 나만이 할 수 있는 것 그리 한 해를 보내고 다시 한 해를 보내야 하는 요즘, 작년과 같은 증상은 없어 다행이다 싶었다. 다만 귀농의 1년차가 더 보태지는구나 하고 나이만 먹어가는 귀농 차수에 부담스러움만 있을 뿐.
그러던 어느 날. 하우스에서 야콘 포장을 하는데 우체부 아저씨가 목청껏 오두막 주인을 부른다. 얼굴에 웃음 가득 안고 건네주는 두 개의 박스.
머리에 두른 수건을 풀고, 털신을 신은채 마루 끝에 넓디한 엉덩이를 간신히 붙이고 앉아 꾸러미를 풀었다. 떡기계에서 가래떡 뽑혀나오듯 줄줄 나오는 것들.
예쁜 리본 달린 털양말과 솜털처럼 부드러운 벙어리 가죽장갑 그리고 산골 추위를 겁주는듯한 구름처럼 포근한 스웨터, 그리고 빨간 지갑... 거기까지면 다행이다. 그 지갑 속에서 나오는 초보농사꾼 몫의 점잖은 넥타이... 이 얼마만에 보는 넥타이인가. 개도 선볼 날 있다고 산골에서도 넥타이 맬 날이 있으리라는 생각에 곱게 접어 넣어보낸 넥타이. 하나하나 그 “정성”이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자꾸 목구멍이 울컥거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에게서 온 선물보따리에는 산골아가들이 눈썰매 탈 때 끼라고 보내준 방수 장갑 세트가 앙증맞게 들어 앉아있었다. 옷을 홀딱벗은 겨울나무에서 꽃을 보는듯했다. 난 이웃에게 놓인 인연의 다리를 얼마나 튼튼히 건사하고 있는지...
두 분 모두 우리 홈에서 만난 분들이다. 얼굴 한 번 못 본 사람에게서 날아온 오색 빛깔의 마음의 선물들...
난 내 몸의 모공만큼이나 많은 정이 담긴 그 정덩어리들을 죽 펼쳐 놓고 해바라기를 시켰다. 그 햇살에 상대방의 마음이 구석구석에서 빛을 발한다. 마루에 앉아 하늘을 보았다. 털신 위로 내려앉은 고운 햇살이 쪽 째진 내 눈 속으로도 비집고 들어오니 감당하기 힘든 물은 그냥 흘러내리고...
작년처럼 가슴은 콩닥이고 울먹여지고 자꾸 목구멍으로 헛바람을 들이켜 보나 바람난 여자처럼 마음은 겉잡을 수 없는 감정이 상한가를 치고... 결국 작년과 똑같은 병이 도진 것이다. 누가 이 기분을 알런지...
이러한 모습들은 내가 산골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안내하는 “길향기”이다.
“길향기”란 삶의 길을 안내하는 향기다. 그것은 한겨울 계곡의 꽁꽁 언 얼음 속에서도 제 빛을 잃지 않고 흐르는 골수와도 같은 것.
나는 그런 “길향기”를 주는 이들이 많으니 눈을 감고도 외진 길을 외롭지 않게 갈 수 있고, 모진 비바람 속에서도 연꽃같은 표정으로 살 수 있고, 마음의 뜰을 잘 단속하며 살아갈 수 있으리. 이 얼마나 벅찬 일인가.
그날 난 하우스에서의 일을 계속할 수 없었다. “길향기” 어지럼증으로...
한 해의 끝이다. 침튀겨가며 나불대던 입은 닫고, 한켠에 비껴나 있던 귓고래를 청소해야겠다. 아궁이에 재를 쳐내듯 그리 고무래로 귀를 청소하면 그동안 말심에 밀려있던 귓심이 신생아의 종잇장 같은 손톱이 자라듯 투명하게 자랄 것이다.

